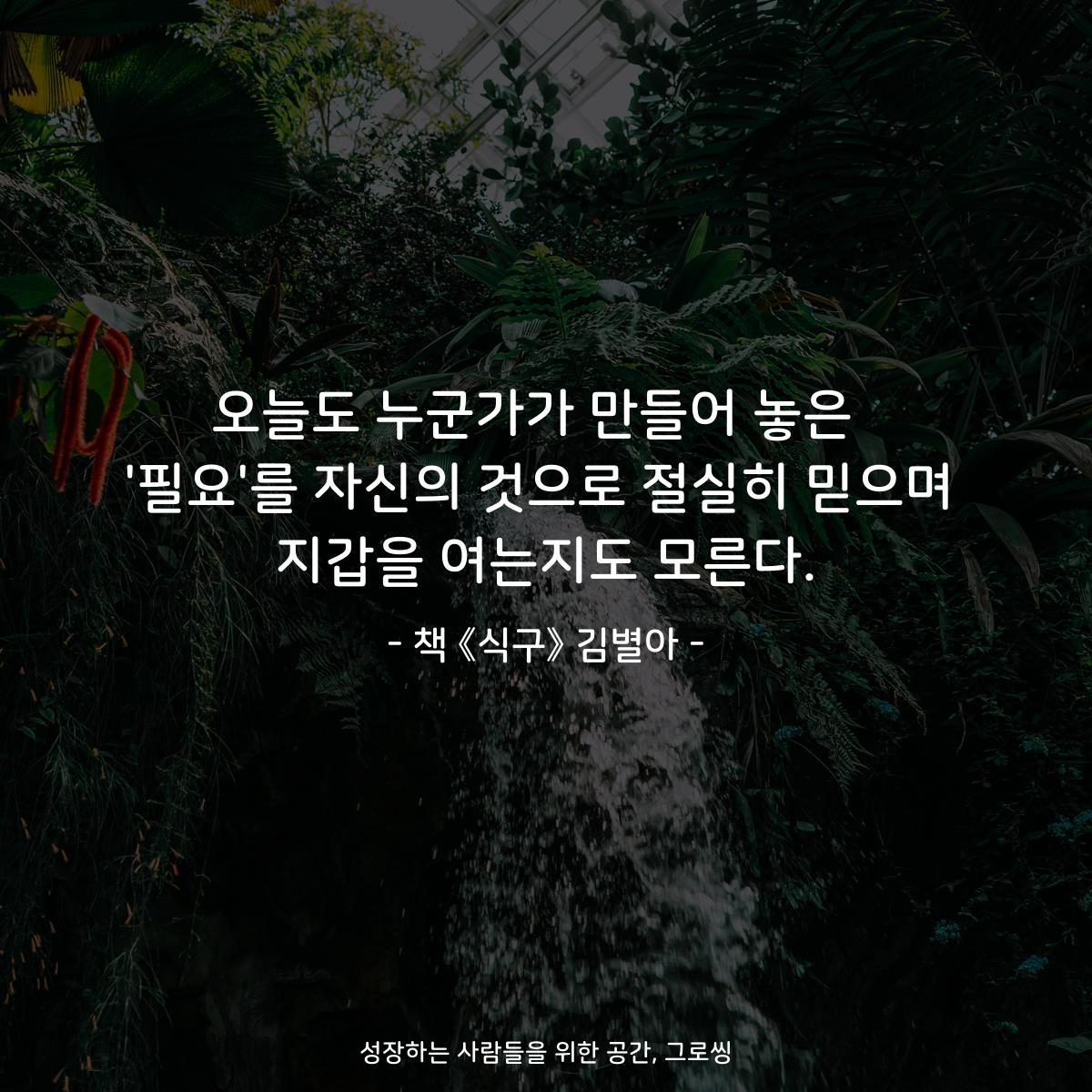- 꾸준히 성장하는 분들을 응원합니다.
식구
김별아
북스캔
목차
<가족, 그 끈끈한 인연>
모과나무/가족, 구원 혹은 상처
150년간의 사랑/내 마음의 윈스턴
식구(食口)/파리의 폭염, 인도의 겨울
페르세베를 따는 법/가족창생
세상을 닮은 가족, 가족을 닮은 세상/히키고모리
<우리가 정말 사랑했을까?>
아버지와 딸/아버지와 아들
어머니와 딸/어머니와 아들
나를 닮은 타인, 형제 그리고 자매
<당신과 내가 만나야 했던 이유>
결혼의 이유/누구와 결혼할까?
그 후로 10년/여전히 그와 함께 사는 이유
사랑을 반대한다?/백설 공주 엽기전
돈텔마마/저는 오늘 꽃을 받았어요./행복한 이혼
<아내 며느리 엄마 그리고 여자>
시어머니라는 이름의 그 여자/아내라는 이름의 그 여자
시집, 매우 특별한 가족/즐거운 소풍
현모양처 변천사
<너를 처음 만났던 눈오는 날을 나는 기억한다>
언젠가 너를 떠나보낼 때까지/행위 그리고 존재
하멜른의 피리 부는 사나이/꽃으로도 아이를 때리지 마라
똑똑한 엄마들은 위험하다/백지와 밑그림
아이가 내게 가르쳐준 것들/엄마와 아빠가 사랑하지 않는다면
미안하다고 말하기가 그렇게 어려웠나요/우리 시대의 맹자 엄마들
천국으로 끌려가다/너의 치외법권을 인정하기 위하여
더보기
출판사 책소개
소설가 김별아의 가족 이야기 - 너무 오래 묻어두었기에 너무 오래 앓아왔던 이야기들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위로가 되는 이름 ‘가족’과 그 누구보다 ‘가족’의 문제를 절실히 안고 가는 ‘여성’에 대한 책이다. 가장 가까운 사이면서도 서로를 깊이 감싸주지 못하고 잘 알지 못했던 ‘가족’의 모습을 딸로서, 아내로서, 엄마로서 살아가는 저자의 경험과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 또 사회적, 문화적 여러 현상들을 촘촘하게 엮어내고 있다. 오랫동안 묻어왔기에 너무 오래 앓아왔다고....그래서 이제는 터놓고 얘기하고 싶다고 말하는 김별아는 이 책에서 때론 통렬하고 뜨겁게 때론 냉정하게 때론 쓸쓸한 마음을 데우는 한 잔의 따듯한 물처럼 나직이 들려주고 있다. 작가 김별아는 이 책을 통해 작가로서의 삶뿐만이 아닌 우리 주변의 평범한 30대 주부의 삶을 진솔하게 보여주고 있다. 가사 노동에 힘겨워하고 자녀교육에도 전전긍긍하고 시댁과 남편과의 관계에서 팽팽한 긴장을 유지하는 모습들이 그것이다.
이런 솔직한 모습들과 더불어 현실적인 문제들-가족의 위기, 해체의 문제, 진정한 가족의 모습과 여성들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도 깊이 있게 담아내고 있다. 그리고 그 고민의 끝에서 김별아는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은 결국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다. 미혼 여성들에게는 정보가 될 수 있고 기혼 여성들에게는 자기 성찰이 될 수 있는 그리고 스스로를 찾고 싶은 모든 이들에게는 위로와 격려가 될 수 있는 낮고, 따듯하고, 깊은 책이다. 가족들은 사진 속에서만큼은 단란하고 행복해보인다. 표지와 본문에 오래된 가족 사진을 실은 것은 그 단란함과 행복함이 사진 속에서뿐 아니라 사진 밖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의 표현이다.
당신에게 가족은 구원인가, 상처인가. - 가족이 있는 풍경들
이 책의 부제이자 프롤로그 제목인 “우리가 사랑하는 이상한 사람들.” 과연 그들은 우리에게 구원인가 상처인가. 친척 혹은 인척 관계 이전에 그 사람들을 온전한 한 인간으로서 받아들이고 사랑할 수는 없는지. 김별아는 가족을 말할 때 함께 있어 더욱 외롭고 아픈 이름이라고 표현한다. 누구도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는 구원이자 상처인 가족, 나를 꼭 닮은 낯선 타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가면서 김별아가 하고 싶은 말은 ‘이상한’ 이 사람들을 이해하고 보듬어 안으면서 동시에 틀에 얽매이지 않는 길을 찾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 주변의 다양한 모습들의 가족(편부모 가정, 동성애 커플, 입양 가족, 재혼 가족, 공동체 가족 등등)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그들을 인정하고 함께 고민해나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김별아의 <식구>에 부치는 찬사
하성란 소설가
어린 시절, 한번쯤 품게 되는 ‘버려진 아이’에 대한 환상은 아이가 최초로 자신의 가족을 부정하고 가족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는 과정이다. 아이는 어딘가에 자신을 낳아준 생부와 생모가 존재할 거라 믿고 자신의 신분 또한 지금과는 영 딴판인 공주이거나 왕자일 거라는 환상에 사로잡힌다. 난공불락의 요새 같던 가족과 가정이 위태롭다. 풍문으로만 들려오던 일들이 더이상 나와 무관하지 않다. 단절과 침묵. 소통되지 않는 가족 안에서 나는 더 외롭다. 이젠 어른들조차 잠재의식 속에 묻혀 있던 ‘버려진 아이’에 대한 악몽이 되살아난다. 진정한 내 가족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김별아는 우리가 무감각하게 흘러버리거나 쉬쉬하는 일들을 주저없이 이야기한다. 돌려 말하지 않는다. 직선적인 문장들은 속도 붙은 화살 같다. 환부를 찾아내고 도려 내려는 시도들에서 여문 손끝을 느끼게 한다. 세상과 인간에 대한 따뜻한 시선이 그의 펄떡이는 문제 의식들과 만났다. 섣부르게 ‘가족 환타지’에 대한 희망을 말하지도 않는다. 그의 글을 읽는 내내 머릿속에 떠오른 것은 달밤, 떨어뜨린 조약돌을 찾아 집으로 돌아가는 헨델과 그레텔의 모습이었다. 조약돌 끝에는 따뜻한 불을 밝힌 집의 창들이 있을 것이다.
전성태 소설가
에덴 이후 매일 새로운 가족이 탄생하나 한번 도 새로운 가족이 출현한 적은 없다. 통념과 억압, 질서와 세습에 순치되어 낡아버린 둥지. 지극히 상식을 중히 여기는 이 지리멸렬한 산문 세계를 부수는 김별아의 메시지는 ‘가족의 복원’이다. 작가가 성찰을 통해 회복하고자 하는 것은 ‘최초의 가족’이다. 사유의 대목마다 기억이 새로웠고, 어느 한 구절 통렬하지 않은 곳이 없었다. 아비가 갓 된 나는 인류를 향해 엎드린 한 어머니의 말씀을 경청하였다.
방민호 평론가
김별아 씨 직업은 소설가, 나는 비평가다. 소위 문단이라는 곳에 출입하게 되면서 내가 가장 먼저 알게 된 작가가 바로 김별아 씨다. 왜 그렇게 되었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그만큼 잘 안다면 안다고나 할까? 그러나 갈수록 모를 사람이 바로 김별아 씨다. 놀랄 만한 단순성 뒤에 복잡함이 숨어 있다. 전통적 이미지 강한 강릉 출신답지 않게 정열과 일탈이 있다. 이번에 만나게 된 김별아 씨의 새로운 에세이집을 통해서 나는 김별아 씨의 이러한 면모를 다시 한 번 절감하게 된다. 겉으로 보면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평온한 작가적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에서는 자기를 둘러싼 가족적 관계를 섬세하게 성찰해 가는 사람이 바로 작가 김별아 씨다. 오늘을 살아가는 여성의 보편적인 고민을 개성적으로 풀어가는 한 사람의 모습이 보기 좋다. 에세이는 과연 사람을 더 밀도 있게 느끼게 해주는 장르인 것이다.
더보기
파트너스 활동으로 일정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