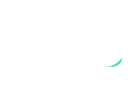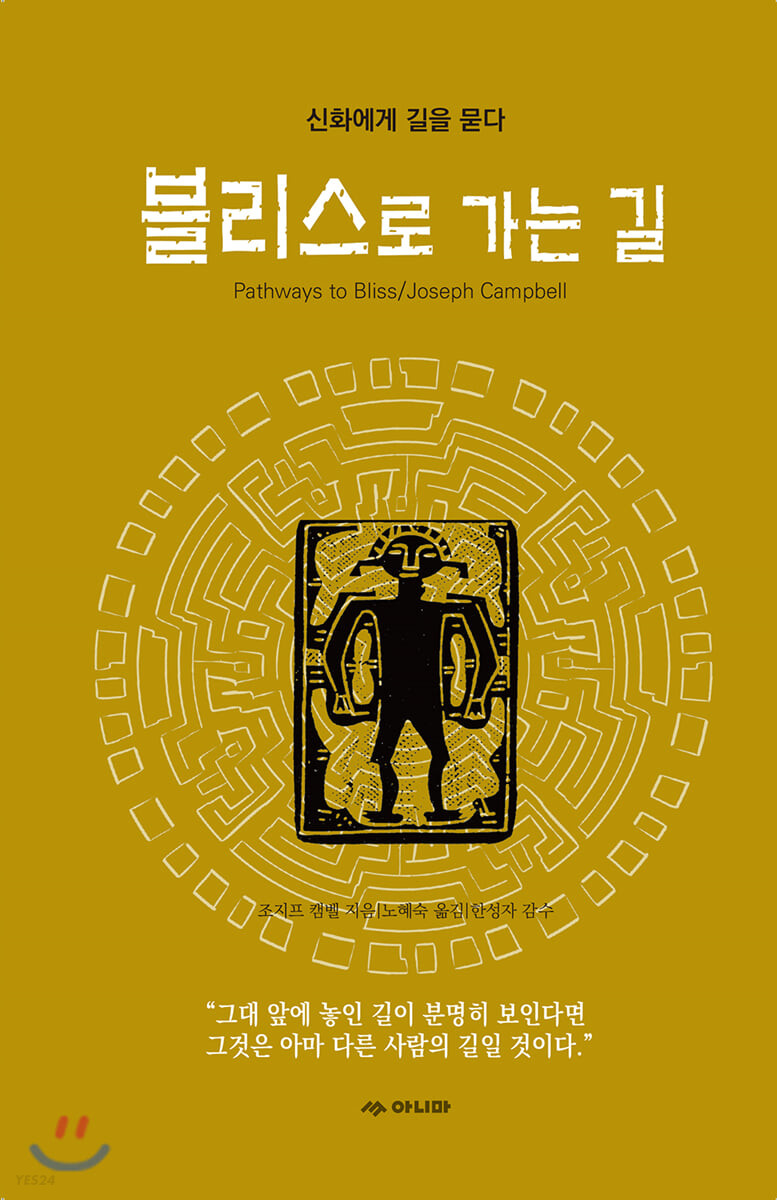- 꾸준히 성장하는 분들을 응원합니다.
블리스로 가는 길
Campbell, Joseph^조지프 캠벨
아니마
책속에서
삶을 긍정하기 위해서는 현실을 그 가혹하고 끔찍한 밑바닥까지 인정해야 한다. 원시사회 성인식은 긍정적 세계관을 주입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어떤 의례들은 너무도 잔인해서 쳐다보기는커녕 글로 읽기도 힘들 정도다. 하지만 그런 의례들은 아이들의 마음에 선명한 이미지를 남긴다. ‘세상은 이런 곳이다. 네가 살기 위해서는 이런 방식으로 살아야 하고 이것은 우리 부족의 전통이다.’
나방이 불을 보고 달려들어 유리창에 부딪히기를 거듭하다가 아침에 친구들에게 돌아가 말한다. “어젯밤 정말 굉장한 것을 보았다네.” 그러자 친구들이 말한다. “그런 건 안보는 게 좋아.” 하지만 나방은 이미 그 불꽃에 사로잡혔다. 나방은 다음날 다시 그 곳에 가 안으로 들어가는 길을 발견하고 마침내 자신이 사랑하는 것과 하나가 된다. 그는 세상을 밝히는 불꽃이 된다.
왜 아무 이유 없이 그가 싫은 것일까? 그가 나의 그림자이기 때문이다. 그에게서 나 자신이 그런 면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들이 보이기 때문이다. 그림자는 나의 일부이지만 나에게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묻어버린 것이다. 따라서 그림자는 위험하고 파괴적인 측면뿐 아니라 우리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는 긍정적인 측면들도 갖고 있다.
더보기
파트너스 활동으로 일정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