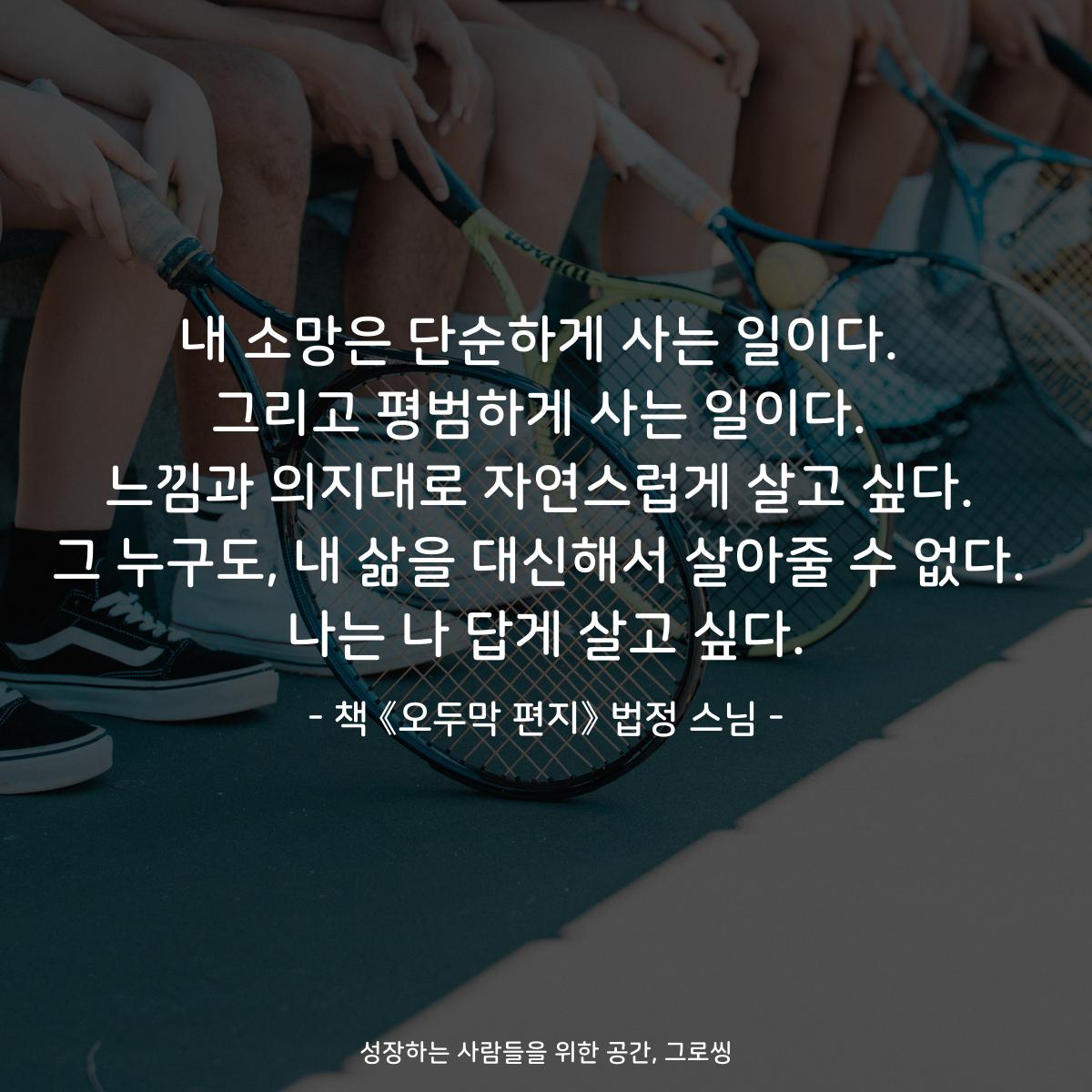- 꾸준히 성장하는 분들을 응원합니다.
오두막 편지
법정
이레
목차
1. 너는 네 세상 어디에 있는가
2.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을 하라
3. 안으로 귀 기울이기
4. 눈고장에서 또 한 번의 겨울을 나다
5. 새 오두막으로 거처를 옮기다
더보기
출판사 책소개
"시계도 없고 라디오도 들을 수 없다. 비로소 시간 밖에서 살 수 있게 됐다. 배가 고파야만 끼니를 챙기고 눈꺼풀이 무겁게 내려온 후에라야 잠자리에 든다. 자연의 흐름을 따라 먹고 자고 움직이니 마음이 넉넉해지고 태평해진다."
사람이 자연의 일부가 됐다는 것, 그것은 문명이 강요한 소유욕과 집착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임을 스님의 글들은 보여준다. 남과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본다는 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뜰에 잡초가 무성해졌는데도 그대로 놓아둔 채 크게 자란 것들만 뽑아냈다. 내 성미를 잘 아는 사람이라면 이런 뜰을 보고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다. 나이가 먹어가는 탓인지, 게으른 변명인지, 요즘에 와서는 생각이 많이 달라져가고 있다. 그대로 두어도 좋을 것에는 될 수 있는 한 손질을 덜하고 그대로 바라보기로 한 것이다."
"이 가을에 많은 것을 정리 정돈하고 있다. 얼마전에는 그 전에 살던 암자에 내려가 20여년 동안 쌓인 먼지들을 가차없이 털어냈다. 이것저것 메모해 둔 종이와 일기장, 그리고 나라 안팎에서 찍은 사진들이다. 필름과 함께 죄다 불태워버렸다. 버릴 때는 미련없이 버려야 한다. 법(진리)도 버려야 할 터인데 하물며 법 아닌 것이랴."
스님의 거처는 대외비다. 열흘 전 쯤 산골에서 바닷가 가까운 곳으로 내려왔다. ||^영하 20도의 그 팽팽한 긴장감||^이 이젠 만만치 않아 잠시 피한한 것이다.
"밤에는 동해바다 일대에 오징어잡이 배들의 집어등이 장관을 이룬다. 어족들은 눈부신 등불을 보고 무슨 잔치인가 싶어 몰려들었다가 잡혀 한 생애를 마친다. 등불에 속는 것이 어찌 고기떼 뿐이랴. 밤의 수상한 불빛에, 과장된 그 불빛에 속지 말아야 한다."
스님의 에세이들은 단순한 은둔자의 감상이 아니다. 몸은 홀로 있지만 인간과 자연과 사회에 대한 명민한 통찰이며, 그가 추구하는 도의 일부다. 그러기에 섣불리 탈출을 결행할 수 없는 도시인들에겐 크나큰 위안이요 자극일 수 밖에 없다.
더보기
책속에서
우툴두툴한 방바닥을 손바닥으로 쓰다듬고 있으면 창밖으로 지나가는 미친 바람 소리도 한결 부드럽게 들린다. 이 방에 나는 방석 한 장과 등잔 하나말고는 아무것도 두지 않을 것이다. 이 안에서 나는 잔잔한 삶의 여백을 음미해 보고 싶다. --본문 15쪽에서
더보기
파트너스 활동으로 일정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